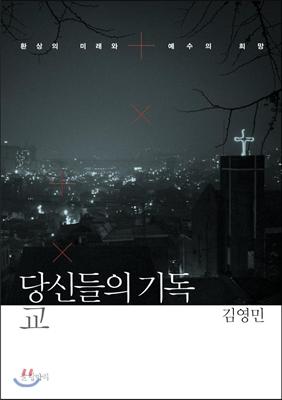
한국개신교는 세간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지탄이 기독교 전체에 가해지는 지탄인지 아니면 개신교 내에만 가해지는 지탄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기독교(개신교)는 무엇인가를 다시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기독교가 같은 의미로 생각될 때가 많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음절지어진 것이다. 한마디로 기독교와 그리스도교는 같다. 그래서 개신교와 카톨릭 그리고 정교회 등을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은 신구약 성서를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렇게 선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개신교도들은 기독교란 의미를 잘 모를 뿐더러, 교회 다니는 이들이 큰 의미에서 기독교인이란 사실도 망각한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 지역, 내 동네의 교회 이상의 교회라는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다녀야지만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김영민의 당신들의 기독교에서는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지금의 한국 개신교의 신학 또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한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문제점을 정작 한국 개신교도들은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 어떤 놀라운 사건을 통해 기원과 시작을, 진리와 감동을 떠들어도, 결국 우리 삶의 구성적 성분으로 남고 그 삶을 매순간 유지하는 것은 일상의 재조직인 것이다. 바늘귀를 통과할 수 없었던 지난날의 낙타들은 새롭게 부활하였고, 놀랍게 번성하였다, 특히 막스 베버 등이 유대 예언종교와 개신교의 세속적 개입을 사회신학적으로 정당화한 이후 낙타들은 태양계의 범위에서부터 나노수준의 기계적 공간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에 걸쳐 떼떼하게 무사통과하고 있다. ‘카이사르냐 예수냐’라는 문제의식은 바야흐로 ‘카이사르=예수’라는 자본주의 시대의 기독교적 정식 속에서 완전히 실종내지 와해 되고 말았다. 우리의 A는 그런식으로 독실한 낙타인 것! [김영민, 당신들의 기독교. 21-22쪽
목사요 교수라는 사회적 기표를 페르소나로 삼아 살아오면서 어렵사리 숨거고 억압해야만 했던 어떤 욕동은 이 수컷 동아리의 패거리 의식 속에서 순발력 있게 추진된다. 모방은 군중을 만들고, 군종은 합류해서 증폭하는 파문처럼 다시 모방을 확대 재생산한다. [김영민, 당신들의 기독교. 36쪽]
장소는 체제와의 창의적인 불화를 새로운 생산성의 동력으로 삼는 소수자들의 진지이자 쉼터이며 공부터이자 놀이터이고, 집이자 그 자체로 다른 길에 들어선 셈이다. 그러나 당연히 그 장소가 정치적, 비평적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전술했듯이, 그것은 종교적 초월적 가치의 현실적 바탕이 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가령 동학에서 한울이 순일하고 쉼 없이 덕을 베푸는 게 성이고, 모든 존재를 한울님의 표현으로 대접하는 게 경이라고 할 때, 그 경의 구체적인 현장의 하나가 곧 장소화인 것이다. [김영민, 당신들의 기독교. 70쪽]
나는 종교의 완성-종교는 결국 믿는 자의 일생에 근거한 한시성과 실존성에 제한적으로 유효하므로 완성이라는 말 그 자체에 어폐가 있긴 하지만-이 어떤 정서와 분위기에 젖어 있는 생활양식, 그리고 그 생활양식에 의해 검질기게 몸을 끄-을-고 다가셔려는 어떤 희망에 의해서만 가능해지리라고 전망한다. 그리고 정서와 분위기, 생활양식과 희망은 이미 (역설적이게도) 종교의 것을 넘어간다. [김영민, 당신들의 기독교. 133쪽]





 가난한 마음과 결혼한 성자, 아씨시의 프란체스코
가난한 마음과 결혼한 성자, 아씨시의 프란체스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