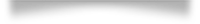“4대강은 자유롭게 생명은 평화롭게” 종교인기도회 후기
글: 두더지
아직 봄이라고 하기엔 이른 날이었나! 등골을 서늘하게 했던 쌀쌀한 바람과 온몸을 비틀게 했던 찬 바닥의 한기가 잊혀지지 않는 지난 2011년 4월 8일, 시청광장에서는 오랜만에 4대강사업으로 인해 탄식하는 생명들을 위한 5대 종단 종교인 기도회가 진행되었다.
신앙의 대상과 기도의 방식은 저마다 달랐지만 생명이 죽어가는 소리에 대한 응답은 너무나 절실하게 한 마음으로 이어졌던 자리였다. 어떤 이는 절을 올리고, 어떤 이는 간절히 두 손을 모았다. 십자가를 손에 들고 예수님 가신 고난의 길을 걷는 절박한 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죽어가고 있는 생명들의 신음 소리를 온몸으로 느끼는 그 발걸음들. 정한수를 떠놓고 하늘 높이 생명의 물을 올리고, 지나온 분노의 시간을 정화시키고자 했던 침묵의 시간. 노래로서, 또는 시로서 죽어간 생명들의 넋을 위로하고, 이 사태의 책임이 있는 이들을 규탄하며, 하늘의 소리를 대언하는 자리였다. 솟구치는 분노와 싱그러운 미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시간! 파괴된 강줄기, 그 속에서 하릴없이 죽어간 생명들에 대한 한없는 미안함이 공존했던 시간이었다.

회상해 보면 많은 이들이 지난 2008년도 촛불의 바다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한반도대운하”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 힘을 모았었다. 노래하는 이들은 노래로, 종교인들은 100일 순례 기도로, 심지어 중고등학생들까지도 서명운동을 벌였다. 그러한 때에 나 역시도 이 작은 땅덩어리에 대규모 운하를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산에 터널을 뚫는다는 놀라운 상상력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하는 와중에도, 더욱이 촛불이 넘실거리는 정권위기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운하’만은 놓칠 수 없다는 그 인내와 끈기에 실로 놀라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해 여름, 내가 간사로 일하고 있던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에서는 대운하 반대를 위한 자전거 순례를 떠났다. 스무 명의 청년들이 여주를 시작으로 상주까지, 한강에서 낙동강에 이르는 대운하 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며, 직접 우리의 눈으로 강줄기를 살피고, 가는 곳곳에 대운하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긴 여정을 내달렸다. 시속 15km로 달려간 강변길, 바쁜 일정이었지만 최대한 나의 두 눈에, 내 마음 깊은 곳에 많은 것을 담아두고 싶었다. 또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싶었다. 그 때, 굽이굽이 이어진 강줄기, 그 속에서 속삭이는 생명들의 목소리는 나에게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것은 말이 아니었고, 어떠한 논리도 아니었다. 다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중하고, 묵직한 침묵의 소리였으며, 생명의 시끌벅적한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은총의 체험이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해 놀라워 했고, 인간의 탐욕에 대해 절망했으며, 나의 본질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시간이었다.

3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한반도 대운하’는 ‘4대강 살리기’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탈바꿈하여, 절반이상의 공정이 끝났고, 이미 사회전반에는 “어쩔 수 없지 않은가!”라는 무력감과 자괴감 섞인 한숨만이 공허하게 메아리치는 모습이다. 하지만 생명을 위한 5대 종단 종교인들의 기도는 다시금 추운 겨우내 꽁꽁 얼어붙은 우리들의 생명감수성을 일깨우기에 충분한 자리였다. 너무나 유약한 인간들은 거대한 사탄의 체제 앞에 무릎 꿇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결코 생명을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땅의 탄식을 하늘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종국에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녹색은총에서 기인한다. 들의 작은 풀에서부터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를 온전히 감싸고 있기에 그렇다. 결국 하나님의 정의로 온전히 감싸인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기도회 중에도 우리를 둘러싼 경찰들의 기세등등하고, 살벌한 위압감은 겸허해 질 줄 모른다. 강의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시작한 4대강사업은 복지예산을 줄이고, 장애인 등급을 낮추고, 노숙인 의료구호비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결국 더 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이 때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정의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일까?” 그것이 기도회를 통해 내가 느꼈던 현실에 대한 분노와 따뜻한 하나님의 임재 사이에서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물음이었다.







 계속된다! 죽음도, 평화의 기도도
계속된다! 죽음도, 평화의 기도도